한국의 노란봉투법이 온 국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처럼, 노동법 문제는 사실 유럽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용자 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유럽 주요 국가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과 비교해 봅시다.

노란봉투법, 유럽 주요국과 비교
1. 독일: '공동결정제도'라는 치트키
독일의 노동법은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부러워할 만한 '치트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결정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기업 경영에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해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파업까지 갈 일이 많지 않은 거죠. 한국처럼 누가 '진짜 사장님'인지 따지는 논쟁도 찾아보기 힘든데요. 이미 산별교섭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큰 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불법 파업에는 책임을 묻지만, 노동자와 사용자가 한 배를 탔다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갈등이 훨씬 덜한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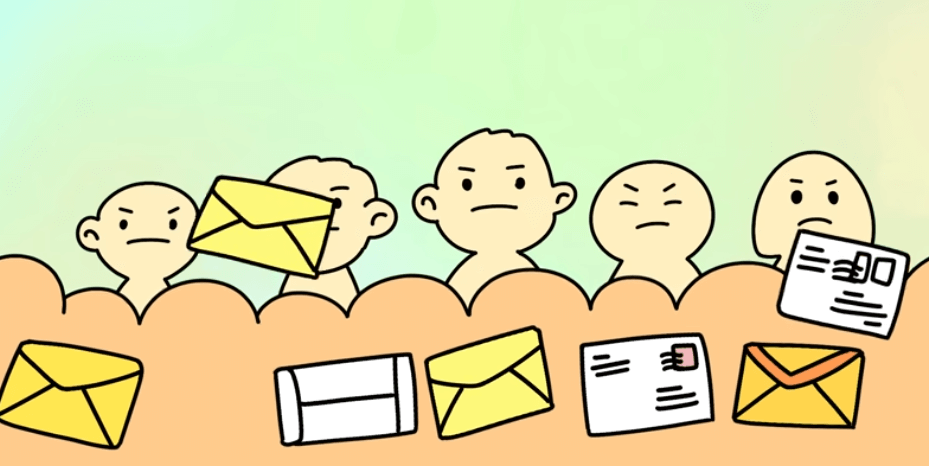
2. 프랑스: '파업은 나의 권리!'
자유와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파업이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니라, 개개인 근로자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개인이 더 많이 지게 되는데요.
한국의 노란봉투법처럼 노조 전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프랑스 법원은 여전히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영국: '액수'로 합리성을 찾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영국은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손해배상액에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조합원 수에 따라 배상액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큰 규모의 파업이라도 노조가 파산할 만큼의 거액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노조라도 손해배상액은 한화 약 16억 원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폭탄 때문에 아예 활동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려는 영국의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노란봉투법, 홀로 가는 길?
한국의 노란봉투법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 범위'를 넓힌다는 점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거나, 파업의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배상액에 상한을 두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의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다르듯, 노동법도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노동과 자본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노란봉투법 주요내용! 노동자의권리
노란봉투법, 그 이름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친근하게 들리지 않나요? 사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파업 후에 받게 될지도 모르는 '노란봉투' 속 살벌한 손해배상 청구서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ppuub.com
노란봉투법 발의자와 시행일
마침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이나 시도되었지만, 아쉽게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좌절을 맛봐야 했던 이 법안은 이번에
ppuub.com
댓글